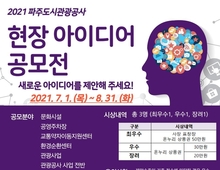“아빠... 할머니한테 가서 아프지 말고 잘 살아요.”
문산의 한 장례식장. 최병록 기자의 아들 도섭(24)이가 염을 마친 아빠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안으며 오열한다. 실신 지경에 이른 딸 정미(26)도 한맺힌 울음으로 아빠와 마지막 인사를 한다. “아빠 미안해, 이제 아프지 않은 곳으로 가서 거기서 건강하게 지내... 그리고 우리하고 꼭 다시 살 거라고 약속해.....”
파주바른신문 대표 최병록 기자가 24일 오전 5시 37분 56세를 일기로 우리 곁을 떠났다. 고인은 신부전증으로 하루 걸러 한 번씩 10여 년 투석을 받았다. 파주병원 의료진은 사인을 ‘급성 관동맥 증후군’으로 판정했다.
“아니, 어젯밤 9시 28분에 카톡으로 무슨 신문 뉴스와 함께 안부를 물었는데 갑자기 오늘 죽었다는 문자가 왔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24일 고인의 친구가 장례식장에 들어서며 한 말이다.
고인은 쓰러지기 전날 밤 늦게까지 원고를 써 이용남 기자에게 보냈다. 그동안 백병원 중환자실에 있는 바람에 쓰지 못한 원고였다. 고인은 이날 밤 12시 넘어 잠자리에 들었다. 고인의 잠자리는 문산 선유리 임대아파트 거실이었다. 새벽 4시 30분 께 방에서 잠을 자던 아들 도섭이가 목이 말라 거실로 나갔다.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어야 할 아빠가 보이지 않았어요. 옆을 보니 아빠가 식탁 의자에 앉아 고개를 젖히고 있어서 아빠 왜 여기서 자느냐고 했죠.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아빠를 바닥에 뉘여 심폐소생술을 했고, 아빠는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바로 119에 전화를 했어요.”
119는 최 대표가 평소 다녔던 일산 백병원으로 내달렸다. 호흡이 다시 멈추는 걸 알아차린 119대원이 급히 파주병원 응급실로 방향을 바꿨다. 그러나 이미 심장이 멈춘 상태였다. 고인은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 밤새 원고를 쓰다가.....
고인은 세상을 떠나기 전인 6월 말 께 평소 앓고 있던 신부전증 등으로 백병원 중환자실과 일반 병동을 오가다가 14일 만에 퇴원했다. 고인은 최근 극심한 스트레스에 휩싸였다. 자신의 자동차와 통장 등이 압류되는 일을 겪어야 했기 때문이다.
“어느 땐가 병록이 형한테 전화가 왔어요. 돈이 좀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이유를 물었더니 무슨 벌금인가, 추징금인가를 법원에 내야 하는데 자세한 건 나중에 말하겠다.”라고 했어요. 고인의 남동생 최병언 씨의 말이다.
사연은 이랬다.
2016년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정 후보 선거운동원인 최영실 파주시의원이 파주신문 이용남 선임기자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3월 두 차례에 걸쳐 200만 원을 건넸다. 이용남 기자는 선거가 끝난 4월 19일 이 돈봉투를 중앙선관위에 신고했다.
이에 앞서 17일, 최영실 의원은 이용남 기자의 양심선언을 막기 위해 최병록 대표에게 600만 원을 파주신문 법인 계좌에 입금했다. 최병록 대표는 이 돈을 파주경찰서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최영실 의원을 징역 8월의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하고 최병록 대표에게도 벌금 400만 원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최병록 대표는 벌금 400만 원을 신용카드로 납부했다. 그리고 추징금 600만 원은 최영실 의원이 입금한 파주신문 계좌에서 납부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파주신문 공동대표인 내종석 발행인(현재 파주인 대표)이 최병록 대표 몰래 600만 원이 들어 있는 통장을 금융기관에 분실신고를 내 계좌를 바꿔버렸기 때문이었다.
최병록 대표는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당시 최 대표는 김준회 기자(현재 파주인신문 근무) 등 7명과 서해바다 물회집에서 직원 회식을 하고 있었다. 점심을 마치고 카드로 결재를 하는데 계속 승인이 나지 않았다. 금융기관에 확인한 결과 계좌 분실신고로 비밀번호가 변경됐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법원에 납부해야 할 추징금 600만 원은 내종석 발행인한테 넘어갔다.
최병록 대표는 내종석 대표에게 600만 원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통보를 수 차례 했다. 내종석 발행인은 묵묵부답이었다. 결국 최병록 대표의 자동차와 개인 계좌가 압류됐다.
- 다음 호에 계속 -